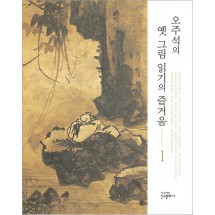도서목록 HOME>도서목록>분야별 도서
관련상품
-
상품 정보
상품 상세설명
차례 차 례
오주석의 『옛 그림 읽기의 즐거움 2』 출간에 부쳐 5
책을 펴내며 9
1 소나무 아래 산중호걸
김홍도의 <송하맹호도> 15
- 옛 그림의 표구 51
2 화폭에 가득 번진 봄빛
김홍도의 <마상청앵도> 61
- 문인화, 옛 선비 그림의 아정雅正한 세계 93
3 겨레를 기린 영원의 노래
정선의 <금강전도> 103
4 딸에게 준 유배객의 마음
정약용의 <매화쌍조도> 149
5 뿌리뽑힌 조국의 비애 민영익의 <노근묵란도> 177
- 조선과 이조 203
6 한 선비의 단아한 삶 <이채 초상> 211
설명 ■ 출판사 서평
『옛 그림 읽기의 즐거움 1』에서는 열한 작품을 선정하여 각각 그림 세계를 낱낱이 밝혔는데, 근 10년 만에 출간되는 두 번째 책에서는 여섯 편밖에 실리지 못하고 불치의 병으로 끝내 절필絶筆하고 말았으니 안타까운 마음 이를 데 없습니다. 그는 작품 하나하나를 이런 방법으로 풀어나가며 한국회화사를 올바로 바로잡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여 집대성하려 했습니다. 그는 왜색倭色을 매우 불쾌하게 생각했다. 증오까지 했다. 왜색 표구가 우리 아름다운 그림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조선시대의 그림을 사랑한 학자가 없었는데, 그것은 그만큼 조선의 그림과 거기에 담긴 조선인의 마음을 읽어냈기 때문일 것입니다.
■ 저자소개
오주석(吳柱錫)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와 동 대학원 고고미술사학과를 졸업했다. 코리아헤럴드 문화부 기자, 호암미술관 및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원을 거쳐 중앙대학교 겸임교수, 그리고 간송미술관 연구위원, 역사문화연구소연구위원, 연세대학교 영상대학원 겸임교수를 역임하였다.
한국 미술의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 전국 방방곡곡에서 강연을 펼쳤던 그는, 2005년 2월 백혈병으로 생을 마쳤다. 저서로는 『오주석의 한국의 美 특강』 『단원 김홍도』 『이인문의 강산무진도』 『오주석의 옛 그림 읽기의 즐거움 1, 2』 『그림 속에 노닐다』 『오주석이 사랑한 우리 그림』 『우리 문화의 황금기-진경시대』(공저) 등이 있다.
■ 책속에서
우리 겨레의 상징, 호랑이
조선 범은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물의 하나다. 그 조선 범을 그린 천하명품 <송하맹호도松下猛虎圖>도1를 볼 적마다 나는 두 글귀를 떠올린다. 하나는 『논어論語』의 ‘위이불맹威而不猛’ 즉“위엄 있으되 사납지 않다”는 말이다. 그림 속 범의 위용과 걸맞은 이 “위이불맹”이란 말은 본래 바른 정치를 하기 위해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다섯 가지 자질 가운데 하나다. 또 하나는 박지원朴趾源(1737~1805)의 「호질」에 나오는, 범이 썩어빠진 가짜 선비를 꾸짖으면서 “나의 본성이 너희 인간들의 본성보다 오히려 더 어질지 아니하냐!”고 호통을 치는 장면이다. 박지원은 김홍도보다 여덟 살 위의 문인으로 자기 시대를 반성하고 새 시대의 전망을 앞장서 제시했던 큰선비다. 아래 일화는 『예기禮記』에 나오는 것인데 역시 호랑이를 이끌어 정치를 말하고 있다.
공자가 태산 곁을 지나는데 어떤 부인이 무덤 앞에서 슬피 울고 있
었다. 공자는 수레의 횡목橫木을 잡고 머리 숙여 조의를 표한 다음,
제자를 시켜 연유를 물었다. “부인이 곡하시는 모양이 분명 큰 슬픔
이 겹친 듯합니다.”
부인이 말했다. “그렇습니다. 옛날 저의 시아버님께서 범에게 물
려 돌아가셨습니다. 또 제 남편도 범에게 물려 세상을 떴습니다. 그
런데 이제 제 아들마저 범에게 물려 죽었답니다.”
공자가 말했다. “어째서 다른 곳으로 가지 않으십니까?” 부인이 답
하였다. “여기는 가혹한 정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공자가 돌아보며 말했다. “제자들아, 명심하거라. ‘가혹한 정치는
범보다 더 사나우니라!(苛政猛於虎)’ ”
후대의 한 학자가 글 말미에 주석을 달았다. “범이 사람을 해치는 것은 덫이나 함정으로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정치가 사람을 해치는 것은 제어할 수단이 없다. 범은 높은 집과 굳게 닫은 문으로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가 사람을 해칠 때는 도망할 곳이 없다. 그러기에 태산 기슭의 저 부인은 가혹한 정치가 없는 그곳을 차마 버릴 수가 없었던 것이다.” 양웅(BC 53~AD 18)*이란 사람은 또 가렴주구苛斂誅求하는 벼슬아치를 빗대어 이렇게 탄식하였다. “범이로구나, 범이로다. 진정 뿔이 나고 날개가 돋친 범이로구나……”
■ 머리말
“푸른 산 붓질 없어도 천 년 넘은 옛 그림, 맑은 물 맨 줄 없어도 만 년 우는 거문고(靑山不墨千秋畵 綠水無絃萬古琴)”란 말이 있다. 우리 선인들은 그림을 펴 걸 때 바깥 경치가 얼비치게 되는 문가나 창가를 삼갔다고 한다. 아무리 곱고 화사하게 그려낸 청록산수靑綠山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조물주가 지어낸 자연, 청산녹수靑山綠水와 맞서 아름다움을 다투는 일은 부질없다고 여겼던 까닭이다. 사실 진정한 화가, 정직한 화가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자연을 마주하고 깊은 절망감에 젖어보았을 것이다. 해질 녘 서편 하늘을 물들이는 장엄한 노을 앞에 섰거나, 한밤 중 아득한 천공에서 무수히 쏟아져 내리는 별무리의 합창을 들을 때, 혹은 동틀 녘 세상 끝까지 퍼져나가는 황금빛 햇살의 광휘를 온몸에 맞으면서, 어느 누가 감히 예술을 논하겠는가. 봄날 작은 꽃망울을 터뜨리는 햇가지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자. 길고 짧고 굵고 가는, 물기 오른 여린 가지들이 이루는 조화와 오만 가지 빛깔, 그것은 기적이다. 가을 새벽 거미줄에 붙들린 조그만 이슬 알갱이에 다가서 보자. 그 깜찍한 비례며 앙증맞은 짜임새도 경이롭지만 알알이 비치는 방울 속마다 제각기 살뜰한 우주가 숨어 있다.
옛 분들의 마음자리는 드넓고 여유로웠다. 그래서 푸른 산이 그대로 그림이 되고, 맑은 물은 저 홀로 거문고를 퉁겼다. 옛 분들은 마음이 참으로 넉넉했기에 날마다 눈으로는 산수화의 걸작을 만끽하고 귀로는 멋에 겨운 풍류 가락을 담아 절로 흥겨웠다. 자연의 생명과 순수는 인간의 문명과 예술을 넘어선다. 거대한 첨단 도시가 갓난아기의 미소보다 경이로울 것이 없고, 인간이 대단한 예술을 창조한다 한들 그 인간의 부모는 여전히 심상한 자연일 뿐이다. 그렇다면 자연을 넘어설 수 없는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줄기차게 그림을 그려온 까닭은 무엇일까? 자연의 신비와 아름다움을 사람만이 유일하게 느끼는 까닭이 아닐까? “무릇 그림이란 마음 가는 바를 따르는 것이라(夫畵者從于心者也)”고 하였다. 나아가 우주 삼라만상 모든 존재도 모두 한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현인들은 말한다.
그러나 그 마음은 결국 한 사람의 작은 정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옛 글에 “사람은 하늘과 땅의 마음을 가진 존재(人者天地之心也)”라고 하였다. 그렇다! 화가는 자신의 아름다운 마음으로 천지의 미묘한 정을 화폭에 그리려는 이다. 자연보다 더 뛰어나서가 아니라, 자연의 마음을 찾고 본떠 배우기 위해 자꾸만 그림을 그리는 이다. 우리 조상들의 마음은 늘 자연을 향해 열려 있었다. 수더분하고 밝고 깨끗했던 겨레의 전통문화, 그것을 일구어온 심지는 대자연에 대한 겸허한 마음, 거기서 우러난 생활의 경건함 그리고 지극한 정성스러움이었다. 꼭두새벽 작은 소반 위에 정화수 한 사발을 정갈하게 길어 놓고 아무도 모르게 소망을 빌었던 옛 아낙의 손길은 언제나 천지신명과 일월성신을 향하고 있었다. 그렇듯 곱고 깨끗한 마음결이 우리 옛 그림은 물론 음악과 무용, 옛 건축과 도자기 그리고 때묻은 목가구며 선인들이 짜낸 낡은 멍석자리 위에도 아직껏 고스란히 스며있다.
날마다 외양이 바뀌어 가는 약빠른 세상살이 속에서, 나 자신 문명의 편리함에 길들여져 자연과 한참 떨어져 살고 있으면서도, 자연을 말하고 그 자연이 낳은 옛 그림의 세계를 이야기하기가 이따금씩 영 멋쩍고 부끄러운 감 없지 않다. 그러나 좋은 것은 변하지 않고 더욱이 가장 좋은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예술품이건 참된 생각이건 혹은 알뜰한 사랑이건 간에 세상에서 진정으로 훌륭한 것은 모두 선하고 결 고운 마음이 빚어낸 것이라 믿으므로, 『옛 그림 읽기의 즐거움』 두 번째 책을 다시 내놓았다.
오주석ㆍ분 야
: 문학
ㆍ저자
: 오주석
ㆍ발행일
: 2018년 4월 16일
ㆍ크기
: 175 * 215 mm
ㆍ정가
: 20,000원
ㆍ쪽수
: 240
ㆍISBN
: 978-89-7668-236-9
상품 정보 고시
도서명 오주석의 옛 그림 읽기의 즐거움 2 저자 오주석 출판사 (학)신구학원신구문화사 크기 175 * 215 mm 쪽수 240 제품구성 상품페이지 참고 출간일 2018년 4월 16일 목차 또는 책소개 상품페이지 참고 -
사용후기
등록된 사용후기
사용후기가 없습니다.
-
상품문의
등록된 상품문의
상품문의가 없습니다.
-
배송/교환정보
고액결제의 경우 안전을 위해 카드사에서 확인전화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확인과정에서 도난 카드의 사용이나 타인 명의의 주문등 정상적인 주문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임의로 주문을 보류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무통장 입금은 상품 구매 대금은 PC뱅킹,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혹은 가까운 은행에서 직접 입금하시면 됩니다.
주문시 입력한 입금자명과 실제입금자의 성명이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며, 7일 이내로 입금을 하셔야 하며 입금되지 않은 주문은 자동취소 됩니다.배송정보
- 배송 방법 : 택배
- 배송 지역 : 전국지역
- 배송 비용 : 3000원 (30,000원이상 무료배송 )
- 배송 기간 : 3일 ~ 7일
- 배송 안내 : 산간벽지나 도서지방은 별도의 추가금액을 지불하셔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주문하신 상품은 입금 확인후 배송해 드립니다. 다만, 상품종류에 따라서 상품의 배송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취소/교환/반품하시는 상품의 신청사유에 따라 배송비는 고객 부담입니다. (ex. 파본 도서,배송 오류 제외)
-취소/교환/반품하실 때는 본사 직원과 통화한 이후 처리 가능합니다.
교환 및 반품정보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 상품을 공급 받으신 날로부터 7일이내는 교환/반품 가능.
단, 도서 보호를 위해 씌운 비닐(랩핑)포장을 개봉하였거나, 포장이 훼손되어 상품가치가 상실된 경우에는 교환/반품이 불가능합니다.-주문하신 것과 다른 상품을 받으신 경우
-파본인 상품을 받으신 경우
-배송과정에서 손상된 상품을 받으신 경우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 소비자의 실수로 상품이 훼손된 경우
- 포장을 개봉하였거나 포장이 훼손되어 상품가치가 상실된 경우
- 탐독의 흔적이 있는 경우- 수령일로 7일이 지난 상품의 경우
※ 고객님의 마음이 바뀌어 교환, 반품을 하실 경우 상품반송 비용은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반품 절차
- 먼저 출판사에 전화하여 반품의사를 알려주세요.
- 도서는 택배 또는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반품 택배비: 고객부담(단, 파본 도서, 배송오류 제외)
- 반품 도서가 출판사 쪽에 도착하고, 도서 확인 후, 환불 처리 진행됩니다.반품 주소
(13174)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377 신구대학교 우촌학사 1층 신구문화사
환불 방법
- 출판사에 전화하여 환불의사를 알려주세요.
- 무통장 입금건은 환불 계좌를 알려주시면 빠른 처리 가능합니다.※취소/반품 신청 시, 환불계좌 미입력시 환불이 지연됩니다.
- 카드 결제 시, 카드 승인취소 절차를 밟게 됩니다. 체크카드는 영업일 기준 3~5일이내 환급 처리 됩니다.
선택된 옵션
-
오주석의 옛 그림 읽기의 즐거움 2+0원
(학)신구학원신구문화사
사업자 등록번호 : 101-82-09197
대표 : 김길준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2021-성남중원-0396
주소 : 경기도 성남시 광명로 377 신구대학교 우촌학사 1층
전화 : 031-741-3055
팩스 : 031-741-3054
E-mail : shingupub@naver.com
Copyright © 신구문화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