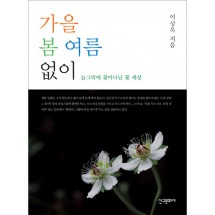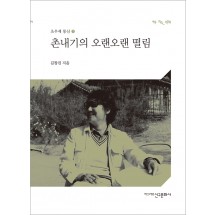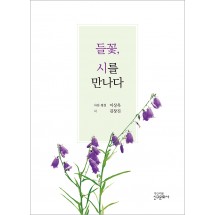도서목록 HOME>도서목록>분야별 도서
관련상품
-
상품 정보
상품 상세설명
차례 책머리에 … 4
제3부(2005년 10월~2011년 4월)
제52信 가을 문턱 … 11
제53信 으스름한 안개에 … 15
제54信 개구리 울음소리 … 20
제55信 대사(臺詞)의 방백(傍白) … 25
제56信 사람살이 깊은 곳 … 30
제57信 산방(山房)의 물소리 … 33
제58信 가을들판에서 줍는 이삭 하나 … 36
제59信 청옥빛 환(幻) … 39
제60信 가난한 동네의 보랏빛 다알리아 … 43
제61信 보라색 색조와 그 변조 … 48
제62信 메밀밭 풍경 … 52
제63信 저들 존재의 무심 … 56
제64信 곰배령 가는 길 … 60
제65信 온몸 낙화되어 있더라 … 64
제66信 샤아프 펜슬 … 66
제67信 서해안 갯벌 바람 그 유혹 … 71
제68信 왜 이리 조용한지요 … 74
제69信 나그네처럼 간이역에서 … 77
제70信 메모리얼 리사이틀 … 81
제71信 개찰 가위질의 찰각거림 … 86
제72信 등색(橙色)의 주황으로 지즐대 오는 … 90
제73信 지난지난 세기의 표정으로 … 95
제4부(2011년 9월~2015년 6월)
제74信 용산역 근처 … 105
제75信 대하여 … 108
제76信 우리 어린날 그 낯설음 … 111
제77信 따뜻했다는 것이다 … 115
제78信 둥근바위솔 시초(詩草) … 119
제79信 부산행, 하룻길에서 … 121
제80信 피아니스트의 영혼 … 126
제81信 수연산방(壽硯山房)에서 … 130
제82信 흐름 혹은 허름의 미학 … 133
제83信 쑥떡빛 쇠똥을 아십니까 … 137
제84信 낯설음 … 140
제85信 바다 그리고 물매화 … 145
제86信 ‘빛깔’에 대하여 … 149
제87信 잔설(殘雪) … 153
제88信 내 생질 그에게 … 155
제89信 병상(病床)의 너에게 … 158
제90信 곤드레만드레 … 163
제91信 ‘살구’로 주고받은 이야기 … 166
제92信 꼴랑 시집 하나로 … 171
제93信 내 생애의 변주 … 174
제94信 꽈리, 그 주홍의 불빛 … 178
제95信 우계 그리고 … 183
제96信 그 실핏줄에서 숨쉬고 있을 것 같은 … 186
제97信 ‘오빠’ 그 설렘 … 190
제98信 우경에게 … 195
제99信 실내의 은하수, 그 호롱불 빛 … 197
제100信 산에 산에 꽃이 … 200
제101信 소곡우접(巢谷寓接) … 205
제102信 민들레 바람되어 … 210
부록 1 : 애란 기행 삼사일 기(愛蘭紀行 三․四日記) … 215
부록 2 : 7일간의 병상기 … 232
평설 : 초우재 거사(居士)의 초상/곽광수 … 250
설명 ■ 출판사 서평
초우재는 저자의 서실(書室) 당호(堂號)인데, 그는 아랫동네에서 35년이나 한 집에서 살다가 수년 전에 산 위쪽으로 이사한 집의 별채인 모양이다. 그러나 비가 쏟아지면 방 앞 축담에 벗어놓은 신발부터 치워야 하고 안채에 건너갈 때는 우산으로 낙숫물을 받아야 하는 무척 불편한, 그리고 쏟아지는 비가 많으면 천장도 살펴야 하고 가족들이 거기에 붙어 있는 <화장실의 낙후성>을 나무라는 것에 가깝다. 초우재를 방문했던 옛 제자가 <세상에 아직 이렇게 살아가는 집채가 있다니!>라는 탄성을 나중에 스승에게 보낸 편지에 담았을 정도이다.
■ 저자소개
김창진
경남 김해에서 출생, 부산 중․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에서 국문학을 공부했다. 가톨릭대학교에서 봉직하다가 정년퇴임을 했다.(문학박사) 한때는 소극장(카페-포켓무대)(1972~4년)운동에 열중했다.
시집‘그대, 우리 자유로울 수 있는가’(1992)
산문집‘나폴레온 크라식에 빠지다’(1996)
들꽃시집 ‘오늘은 자주조희풀 네가 날 물들게 한다’(2013) 및 ‘저 꽃들 사랑인가 하여하여’(2015)를 출간하였다. ‘초우재 통신’(2017)은 저자가 편집해 놓은 유고를 간행한 것이다.
■ 책속에서
서론(11-14p)
가을 문턱
달밤에 할 일이 없으면
메밀꽃을 보러 간다.
섬돌 가 귀뚜라미들이
낡은 고서(古書)들을 꺼내 되읽기 시작할 무렵
달밤에 할 일이 없으면
나는 곧잘 마을 앞 메밀밭의
메밀꽃을 보러 간다.
병든 수숫대의 가슴을 메우는
그 수북한 메밀꽃 물결,
때로는 거기 누워서
울고도 싶은 마음.
아, 때로는 또 그 속에 목을 처박고
허우적거리고 싶은 마음.
(박성룡; 메밀꽃)
S형,
올해의 가을은 이 시 때문인지 모르겠네요.
해마다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오는 철에 꼭 앓는 버릇이 이번에도 틀림없이 찾아온 것이.
참, 박성룡의 이 시 ‘메밀꽃’, 철맞이 인사로 내가 보내드렸지요.
마음이 먼저 아프기 시작했는지, 몸이 그랬는지, 해마다 이 문제는 풀리지 않아요.
숲 속에 취해 있으면
그 취기로 도는
잠머리와, 잠이 오기 전의
마즈막,
그 나눌 수 없는 경계,
문득 잡히는
첫 가을 새벽의
순간, 그 순간일수록
새로워라.
(졸시 ‘스스로와라 스스로와라’의 셋째 연)
그 무더운 여름에서 어느 아침 한 순간에 잡히는 가을 느낌, 그러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가을앓이, 그러나 그건 해마다 새롭게 다가와선 나를 심하게 괴롭힙니다. 이러고 나야 나는 가을 속에 확실히 앉게 되는 모양입니다.
친구 따라 한 십년 만에 제주도를 갔습니다. 여전히 많은 오름들과 남국의 정취가 異國스러워 우리들은 쉬이 나그네가 되는 기분입니다. 하얀 벽의 호텔이 조용해서 더욱 마음에 들었습니다. 밤에 멀리 海潮音이라도 들려올까 하고 바닷가로 갔다가 돌아오면서 근처의 호텔들을 기웃거려 보았습니다. 거대한 한 호텔은 ‘분수 쇼’란 게 있다며 법석거렸습니다. 그 옆의 다른 호텔에는 들어서자 음악이 다가왔습니다. 로비보다 조금 낮은 층의 커피숍에서였는데, 그건 생음악이었습니다. 바이올린과 피아노의 연주였습니다. 그리로 내려가려다가 우리는 무엇 때문인지 멈칫하고는 그것을 끼고 내려가는 더 아래의 또 다른 로비쪽을 갔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쉬었어요. 음악이 연주되는 위층은 복층의 구조로 높은 천장 쪽이어서 그 음악들이 그냥 내려오고 있어 우리는 훔치는 기분으로나마 즐길 수 있었습니다. 올드 불랙죠 같은 것, 보리밭 같은 것, 대개는 그런 낯익은 것들이었습니다. 거기선 차도, 가벼운 술도 마실 곳이 아닌데도 때론 그 음악들이 잘못하면 울먹거리게 할 번했습니다. 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홀에, 그러니까 그 현장에 자리잡지 않은 것이 참 잘했다고 생각되었어요. 그 분위기에 놓이면 거의 틀림없이 울먹거렸을 테니 말입니다. 아이고 이 나이에 말입니다. 그것도 친구 앞에서요. 우리 年齒가 되면 감정에 너무 흔들리게 될 때는 이를 악물어야 되겠기에 입니다.
서울에 돌아왔더니, 어느 고마운 분이 보내준 좋은 음악회의 티켓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와그나의 ‘니벨룽의 반지’ 4부작 공연의 앞 뒤 날짜에 같은 오케스트라 같은 지휘자의, 정경화와의 협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가 지휘하는 것은 매 번 역사가 된다’ 할 정도로 세계음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며 지켜보고 있는 최전성기의 지휘자라고 발레리 게르기예프를 소개하고 있었어요. 내가 간 날의 연주곡들은 브루흐 바이올린협주곡 1번과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5번 등이었는데, 시작되기 전부터 자꾸 순서가 바뀐다는 안내 모니터에서의 알림이 있더니, 먼저 오케스트라의 몇 소곡 연주에 이어 5번의 연주가 있었습니다. 집에서 CD로 들을 때는 그리 나를 사로잡지 못했는데, 역시 유명한 교향악단의 연주, 그 현장음악은 참 취하게 하더군요. 악장마다 되풀이되는 주제곡의 변주에서는 많이 나를 흔들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참 묘한 일이 그만 생겨버렸습니다. 마지막 남은 이날의 하이라이트, 브루흐 1번의, 바이올린협연 차례였는데, 정경화가 바이올린을 들지 않고 무대에 오른 것입니다. 열광하는 박수 끝에 그녀는 오늘 연주할 수 없게 된 사연을 말하면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연습 도중에 검지손가락에 이상이 생겨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주를 해도 완벽할 수 없을지 모른다는 불안을 앞세운 듯했습니다. 청중의 모두가 박수로 ‘이 시대 최고의 비루투오조로 군림하고 있는’ 이 바이올리니스트를 위로했습니다. 나는 이때에 아쉬운 듯하면서도 안도의 숨을 쉰 듯했으니, 내가 생각해도 참 묘한 느낌입니다. 주최자 쪽의 아나운서먼트에서는 오늘 못 들은 연주는 며칠 뒤의 두 번째 날 연주 때에 초대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뒤 그 좋은 연주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 날에 있을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6번 ‘비창’이 미리 나를 숨죽이게 했던 것 같네요.
S형,
그날 세종문화회관 로비에서 구입한, 그날의 지휘자가 비엔나 필하모닉과 연주한 차이코프스키의 그 5번의 실황녹음 CD를 요새 자주 듣고 있습니다. 때로는 감동적이나 어떤 때는 이상하게도 별로입니다. 조금씩 멀어가는 내 귀 탓인지, 너무 오래 된 우리 집 오디오 탓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님, 이제는 가을이 문턱을 어느새 넘어섰기에서인지요.
■ 머리말
한 연예인이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는 헤밍웨이의 어록을
어느 자리에서 인용했다.
나는 내 첫 산문집(1996년)의 첫 글 첫 문장에서 ‘물이 강을
담았다’라고 물가의 우리 고장 사람들이 홍수 때 강둑에 올라
서서 하던 말을 기억했다.
내가 뭘 해서 글을 담을 수 있으랴.
나는 언제나 비에 젖는다.
내 생애가 어릴 때부터 그랬을 것이다.
내 이 책의 글들은 ‘촌내기의 오랜오랜 떨림’이다.
세상에 나는 떨고 있다.
세상이 내 비에 젖지 않아서인가.
초우재(草雨齋),
멋 내느라 寓居를 自號했다. 거기서 친구들에게 제자들에게
지인들에게 또는 세상에 편지를 썼다.
내가 보낸 첫사랑 편지는 누구였지. 그애는 여태 반응이 없다.
내가 어찌 남의 마음을 담을 수 있으랴.
다들 비에 젖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도 떨고 있다.
畏友 곽광수(불문학) 교수가 내 이 하찮은 글들에서 나를 담아
보려 애썼다. 내가 너무 작은데 큰 그릇을 불러 담으려 했다.
내가 더욱 왜소해 지는 느낌이다.
고마우이. 부끄럼과 함께.
2015년 가을ㆍ분 야
: 문학
ㆍ저자
: 김창진
ㆍ발행일
: 2017년 3월 20일
ㆍ크기
: 152*195*19
ㆍ정가
: 15,000원
ㆍ쪽수
: 280
ㆍISBN
: 978-89-7668-229-1
상품 정보 고시
도서명 지난지난 세기의 표정으로 저자 김창진 출판사 (학)신구학원신구문화사 크기 152*195*19 쪽수 280 제품구성 상품페이지 참고 출간일 2017년 3월 20일 목차 또는 책소개 상품페이지 참고 -
사용후기
등록된 사용후기
사용후기가 없습니다.
-
상품문의
등록된 상품문의
상품문의가 없습니다.
-
배송/교환정보
고액결제의 경우 안전을 위해 카드사에서 확인전화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확인과정에서 도난 카드의 사용이나 타인 명의의 주문등 정상적인 주문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임의로 주문을 보류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무통장 입금은 상품 구매 대금은 PC뱅킹,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혹은 가까운 은행에서 직접 입금하시면 됩니다.
주문시 입력한 입금자명과 실제입금자의 성명이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며, 7일 이내로 입금을 하셔야 하며 입금되지 않은 주문은 자동취소 됩니다.배송정보
- 배송 방법 : 택배
- 배송 지역 : 전국지역
- 배송 비용 : 3000원 (30,000원이상 무료배송 )
- 배송 기간 : 3일 ~ 7일
- 배송 안내 : 산간벽지나 도서지방은 별도의 추가금액을 지불하셔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주문하신 상품은 입금 확인후 배송해 드립니다. 다만, 상품종류에 따라서 상품의 배송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취소/교환/반품하시는 상품의 신청사유에 따라 배송비는 고객 부담입니다. (ex. 파본 도서,배송 오류 제외)
-취소/교환/반품하실 때는 본사 직원과 통화한 이후 처리 가능합니다.
교환 및 반품정보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 상품을 공급 받으신 날로부터 7일이내는 교환/반품 가능.
단, 도서 보호를 위해 씌운 비닐(랩핑)포장을 개봉하였거나, 포장이 훼손되어 상품가치가 상실된 경우에는 교환/반품이 불가능합니다.-주문하신 것과 다른 상품을 받으신 경우
-파본인 상품을 받으신 경우
-배송과정에서 손상된 상품을 받으신 경우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 소비자의 실수로 상품이 훼손된 경우
- 포장을 개봉하였거나 포장이 훼손되어 상품가치가 상실된 경우
- 탐독의 흔적이 있는 경우- 수령일로 7일이 지난 상품의 경우
※ 고객님의 마음이 바뀌어 교환, 반품을 하실 경우 상품반송 비용은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반품 절차
- 먼저 출판사에 전화하여 반품의사를 알려주세요.
- 도서는 택배 또는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반품 택배비: 고객부담(단, 파본 도서, 배송오류 제외)
- 반품 도서가 출판사 쪽에 도착하고, 도서 확인 후, 환불 처리 진행됩니다.반품 주소
(13174)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377 신구대학교 우촌학사 1층 신구문화사
환불 방법
- 출판사에 전화하여 환불의사를 알려주세요.
- 무통장 입금건은 환불 계좌를 알려주시면 빠른 처리 가능합니다.※취소/반품 신청 시, 환불계좌 미입력시 환불이 지연됩니다.
- 카드 결제 시, 카드 승인취소 절차를 밟게 됩니다. 체크카드는 영업일 기준 3~5일이내 환급 처리 됩니다.
선택된 옵션
-
지난지난 세기의 표정으로+0원
(학)신구학원신구문화사
사업자 등록번호 : 101-82-09197
대표 : 김길준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2021-성남중원-0396
주소 : 경기도 성남시 광명로 377 신구대학교 우촌학사 1층
전화 : 031-741-3055
팩스 : 031-741-3054
E-mail : shingupub@naver.com
Copyright © 신구문화사 All Rights Reserved.